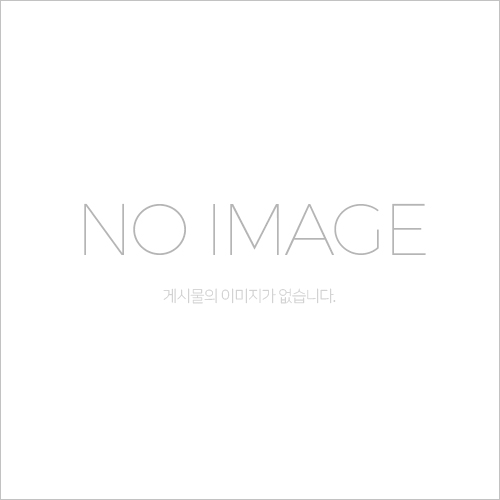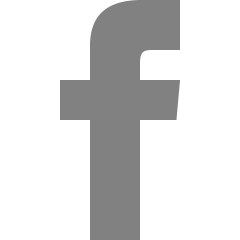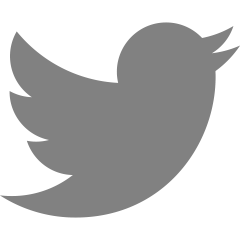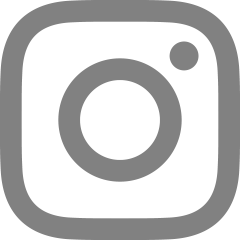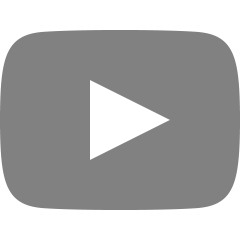깊이에의 강요
단편소설 "깊이에의 강요 (파트리크 쥐스킨스)" 의 인용과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유엔은 책을 덮었다. 종이가 스치며 새 책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표지는 아직 반질반질했고, 손 닿은 자리엔 자국도 남지 않았다. 그만큼 짧고 간결한 이야기였다. 「깊이에의 강요」는.
시메가 자신에게 어째서 이 책을 권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이야기 속 여류화가는 자신과 꼭 닮아있었다. 타인의 잣대에 흔들리고, 평가에 귀 기울이는 위태로운 사람. 갈대처럼 흔들리며 바람이 불어오는 것마저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그런 '깊이' 없는 사람.
물론 이야기의 교훈은 정반대의 것이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라도 그는 결국 타인일 뿐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죽음마저도 예술 일부가 되고, '자신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하나의 화제를 더할 뿐이라는 것. 가령 그런 것이다. "이전에 내가 평론한 한 여류화가가 있었지.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야···."로 시작하는 와인 한 잔의 안줏거리가 되는 이야기들.
무엇을 느꼈는가, 후유엔은 책을 덮은 채 잠시 고민했다.
처음으로 떠올린 것은 자신 또한 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면 이 비운의 화가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라는 것. 상공 139미터 위에서 낙하한 한 사람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순간의 그녀는 마모되어 감정조차 닳아버렸을지언정 자유를 느꼈으리라. 타인, 평가, 자신의 예술과 누군가의 강요. 그런 것들은 하늘 가까이에서 내려보면 단 하나의 점밖에는 되지 않는다. 후유엔은 끈질기게도 새들을 좋아했다. 자신의 이름이 제비이기 때문인지, 그들의 날개를 동경하는 것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다음으로 떠올린 것은 죽은 화가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다. 후유엔은 죽음에 이른 마음을 알았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본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이야기'를 볼 때면 늘 느낄 수 있었다. 막막함과 자괴감, 향하는 방향 없이 되돌아와 자신을 찌르는 분노. 얇은 종이 한 장과 수많은 글자를 넘어 부정의 감정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후유엔은 동정할지언정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와 그녀는 닮았으나, 그는 그녀가 되고 싶진 않았다.
후유엔은 가름 끈을 끼워 둔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굳이 찾지 않아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비트겐슈타인인가 하는 사람의 책을 받아들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후유엔은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동시에 가장 아프게 다가왔다.
칼을 제 손에 쥐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그것은 무기가 될 수도, 요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춤을 추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겠지. 화가에게 그 책은 손잡이가 없는 칼이었다. 쥐는 순간 손안에 상처를 내고 마는 칼.
그래서, 깊이는 무엇일까? 그것만은 길게 생각을 이어가도 알 수 없다. 누군가는 그리는 이의 감정이라고 할 테고, 누군가는 경험을 담은 기억이라고 할 테다. 단순히 뛰어난 공간감을 이야기하는 평론가도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고민을 끌어내는 그림이 '깊이 있는 그림'이라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다. 당장 길거리에 지나는 이들에게 '깊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어냐고 물어봐도 비슷할 것이다. 바다와 심해, 손안에 들린 컵 한 잔의 깊이, 감정적인 깊이···. 틀린 대답은 하나도 없잖은가.
알 것도 같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당신은 이 책으로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나. 해석은 자신의 몫이라지만 답지를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물론 당신에게 되묻지는 않을 것이다. 때론 덮어두어 좋은 이야기가 있고, 되새길수록 변하는 이야기가 있다. 「깊이에의 강요」는 시메 히비오가 후토리 후유엔에게 던진 난제로서 책장 한가운데 꽂혔다. 후유엔은, 잠에 들기 전까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고민했다.
* 좋은 책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고 싶어 추천해주신 다음날 서적을 구매했습니다.
여유가 하루정도 더 있었더라면 금방 읽고 관련 롤플도 했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로그써왔습니다)
글에서 표현된 감상은 제 감상이 아닌 후유엔의 감상입니다. 어쩜 내용이 참 애랑 잘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론가를 욕했습니다.
철학적인 해석같은 건 자신이 없어 ^^;;; 적당히... 써보았는데 모쪼록...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